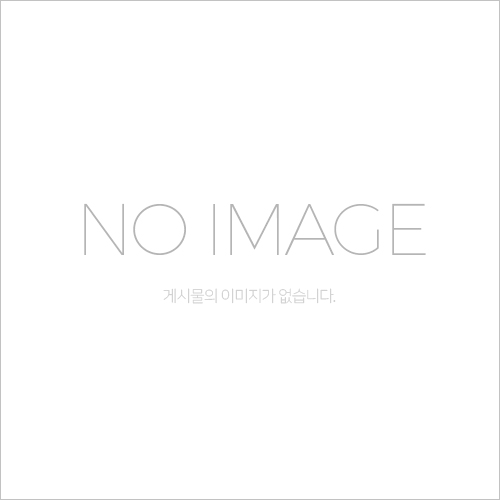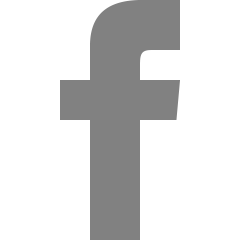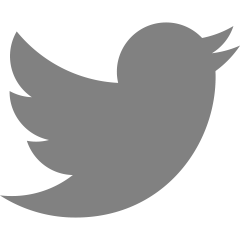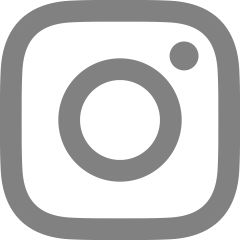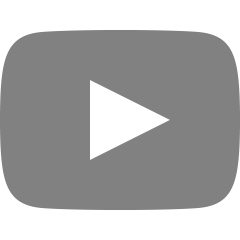트라우마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인터뷰를 했던 이들은 호주 시드니에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다. 이들은 정신과 자문 의사와 협력하면서도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평가하면서 치료 지원을 제공하는 다학제 팀에서 일했다. 연구자는 이들에게 학대 경험이 존재하는 여성 청소년 지원 활동에서 트라우마를 어떤식으로 개념화하는지 물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첫째, 학대 경험에 관한 평가와 트라우마에 대한 개입을 부차적인 것으로 본다는 관점이다. 일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들은 학대가 정신건강과 관련은 있으나 일차적 중요성을 가지는 건 아니라고 보았다. 즉 학대 경험 여부는 정신건강을 평가하는 다양한 항목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애기이다.
둘째, 학대와 트라우마, 정신의학적 병리의 본질적 관련성을 지지하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을 지닌 사회복지사들은 여성 청소년들이 경험했던 폭력이 그들의 정신의학적 병리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정신보건사업에서 이를 다루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이들은 학대로 인해 여성 청소년들이 보여지는 증상, 이를 이해하기 위한 표준화된 진단 도구를 중요시했다. 이런 진단 도구들이 트라우마 상의 복잡성 속에서 확실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셋째, 학대 및 트라우마를 사회정의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을 지닌 사회복지사들은 젊은 여성의 폭력 경험을 성별에 전제한 억압이라는 폭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이야기했다. 또한 그들은 내담자와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었고, 때로는 정신보건 분야의 전통적 상담 방식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연구는 트라우마 개념이 점점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학대를 경험했던 생존자를 최전선에서 만나보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트라우마 개념을 활용하는지 잘 보여주기도 한다. 트라우마는 여성의 정신적 고통을 의료화하고 젠더 불평등 문제를 작은 문제로 만드는 부권주의적 방식으로 적용될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정의 관점에서 페미니즘 운동의 한 부분과도 연결될 수 있다.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일상적 용어가 된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도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상태가 아닌, 불평등한 사회질서를 비판하고 새로운 질서를 생산하는 잠재력을 가진 용어로써 ‘트라우마’ 개념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문: 시민건강연구소
Filed Under: 건강, 문화, 사회